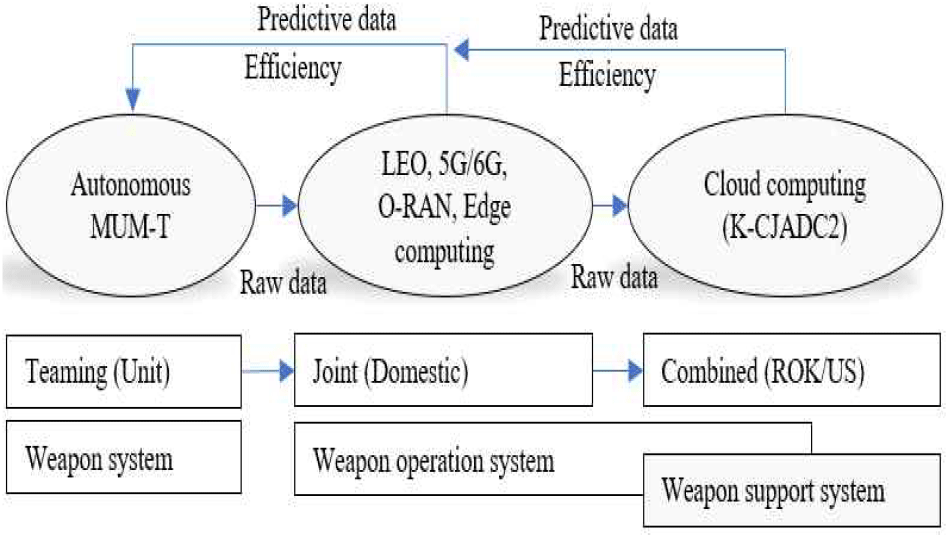1. 서 론
21세기 국방 분야는 인공지능(AI), 무인체계(UMS), 저궤도 위성통신(LEO), 차세대 지휘통제체계(C2)의 융합을 통해 전략적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다. 미 육군은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2017–2042』를 통해 무인항공기(UAV), 무인지상차량(UGV),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무인탄약(UM), 무인지상센서(UGS) 등 다양한 무인자산을 포함한 복합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1] 이를 유·무인 복합체계(Manned–Unmanned Teaming, MUM-T)로 통합하여 인간–기계 협업(HMC)의 중심 축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2]
미 국방부(DoD)는 MUM-T 복합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율성 (Autonom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보안 네트워크(Secure Network), 인간–기계 협업(HMC)의 네 전략 영역을 기준으로 핵심 기술군을 구조화하였으며, 각 영역은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AI/ML), 개방형 아키텍처, 전자기 스펙트럼 제어, 사이버 보안,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MI) 등의 기술로 구성된다.[2] 이러한 기술 구조는 CJADC2 (Combined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전략에 통합되어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DMO)을 실시간 지휘통제 네트워크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정립되고 있다.[3]
LEO 기반 통신 역시 전략기술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스페이스X(SpaceX)의 스타실드(Starshield) 위성군은 초고속·저지연 통신망을 제공하며, 국방부는 2029년까지 100기 이상의 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4] 해당 위성망은 군 전용으로 고급 암호화 기능과 Ku, Ka, E-band 주파수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상업용 통신체계(COMSATCOM)와의 통합 운용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 통합 흐름은 단순한 시스템 채택을 넘어 국방 전략, 예산 구조, 무기체계 운용 및 작전 수행 방식 전반에 걸친 구조적 재편(re-architecture)을 요구한다. 특히 AI–MUM-T–CJADC2–LEO로 구성되는 전략 기술군은 상호 융합을 통해 다영역작전 수행 역량과 실시간 지휘통제 능력을 동시에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RDT&E(Research,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투자 흐름은 전략적 분석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분석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다. 첫째, NATO, NIST, DoD 등 주요 문헌의 기술 정의를 기반으로 AI, CJADC2, LEO·B5G, MUM-T 등 전략 기술군을 위 네 가지 전략 영역으로 분류·구조화하였다.[2][5][6][7][8] 둘째, 『Defense Budget Materials–FY2025』에 포함된 1,122개 R-1 항목의 세부 예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3년(비교년도) 대비 2025년(기준년도)의 예산 증감 흐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9]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MUM-T 기반 기획체계 정립, LEO 기반 통신 인프라 전략, K-CJADC2 실증 플랫폼 구축, 기능별 예산코드 신설, 전략기술 펀드 조성, B5G 기반 통신 인프라 고도화, 연합작전 시나리오 적용 등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통합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기술의 융합이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 전장 환경과 정책 설계에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우리의 AI MUM-T와 B5G-LEO 통신 융합 전략 수립의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UMS)의 발전은 현대 국방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으며, 특히 MUM-T는 전투 효율성과 작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통합 운용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육군 무인항공기체계센터(USAUCE)는 MUM-T를 “작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융합 운용 체계”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UAV, UGV, USV, UUV, UM, UGS 등 다양한 무인 플랫폼이 유인체계와 실시간 협업하는 다층적 네트워크 기반 작전환경을 구현하고 있다.[1]
무인체계의 자율성 수준은 미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시한 ALFUS(Autonomy Levels for Unmanned Systems)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량적으로 정의된다. ALFUS는 자율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무인 시스템의 효율성, 신뢰성, 운용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며, 특히 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고차원적 자율성을 실현하는 핵심 평가도구로 활용된다.[2]
이러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미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정보센터(DTIC)는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2017–2042』에서 인간–기계 협업, 자율화, 상호운용성, 보안 네트워크의 네 가지 전략영역을 중심으로 14개 핵심 기술 분야를 제시하였다. 주요 기술군에는 AI/ML, 개방형 아키텍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사이버보안, HMI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전장에서 무인체계의 민첩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영역작전(MDO)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형성한다.[1]
지휘통제체계 측면에서, 미 국방부는 기존 JADC2(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에 ‘Combined’ 개념을 통합한 CJADC2(Combined Joint All-Domain C2) 전략을 정립하였다. CJADC2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전장 도메인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실시간 정보 융합을 통해 지휘관의 정밀한 결정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휘통제체계이다. 이 체계는 데이터 중심성, 무결점 보안, 임무 파트너 환경, 상호운용성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여 설계되고 있다.[3]
통신 인프라 측면에서는 민간 우주기업 SpaceX가 개발한 Starshield 기반 LEO 위성체계가 도입되어 초고속·저지연·고신뢰 통신망이 구현되고 있다. 해당 위성망은 미사일 경보, 전술통신, 연합군 간 실시간 연동 등을 지원하며, 상업용 위성과 군 전용 위성을 통합 운용하는 상업용 통신체계(COMSATCOM) 구조와의 연계성을 갖춘다.[4]
나아가, 국방용 B5G(Beyond 5G) 전략은 CPS(Cyber-Physical Systems) 기반의 분산형 전술 통신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MUM-T 작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초연결성 및 초저지연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 통신 체계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AI 기반 데이터 분석, 자율제어 기능 등을 포함하며, 전장 내 지휘통제체계의 실시간성, 복원력,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9]
결과적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MUM-T)의 고도화와 CJADC2 전략, 그리고 LEO·B5G 통신기술의 통합은 미래 지휘통제체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무기체계 운용 및 전장통신 구조를 넘어서는 국방 전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MUM-T)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AI), 지휘통제(C2), 통신기술의 융합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전략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NATO와 미국은 이를 중심으로 기술적·작전적 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있다. NATO는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2020–2040』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자율무기, 우주 기반 통신체계 등의 전략적 기술 융합이 미래전 수행능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CEPA(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는 NATO가 AI 기반 무기체계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이를 다영역작전(Multi-domain Warfare, MDW)에 통합함으로써 작전 시너지와 동맹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7] 미군 또한 유사한 방향에서 MUM-T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육군의 Project Convergence, 해군의 Project Overmatch, 공군의 ABMS(Advanced Battle Management System)는 CJADC2 체계로 통합되며, 이들 모두가 유·무인 협업과 데이터 중심 전투 수행을 기술적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다영역작전 환경에서 AI 기반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초고속 통신 인프라의 연계는 전술적 대응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요소로 인식된다.[1]
국내에서는 김미선·노유찬(2021)[10]이 유·무인 복합체계의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형 기술 발전 경로와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MUM-T 구현을 위한 국방 R&D 투자 확대, 관련 법제 정비, 민·군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 UAV 운용을 위한 공역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UAV 공역 분류 및 관제방식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운용 기반을 제공하였다.[11]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장 개념의 전환과 작전환경의 재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략 기술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CJADC2, LEO 위성통신, B5G 기술과의 융합은 미래형 지휘통제체계 구축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며, 이는 곧 국가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지속적인 기술투자의 당위성을 부각시킨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기술 전략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도 정비, 예산 배분, 민군 통합 연구개발 추진·확대가 요구된다.
3. 국방 전략기술 진화와 예산 흐름 분석
미 국방부(DoD)는 2022년 2월, 디지털·AI 역량을 통합하고 국방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CDAO(Chief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를 신설하였다. 이는 데이터 중심의 국방 운영과 AI,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파편화된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인 전략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따른 조치였다.
그림 1의 CDAO 조직도는 이러한 구조 개편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식으로, 최고 책임자인 CDAO를 중심으로 정책(Policy), 운영(Operation), 데이터(Data), 인공지능(AI), 획득(Acquisitions) 등 다섯 개 주요 기능별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직은 기존의 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JAIC), Chief Data Officer, Defense Digital Service, Advana 프로그램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기능들을 통합하여 국방부 내 디지털·AI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수준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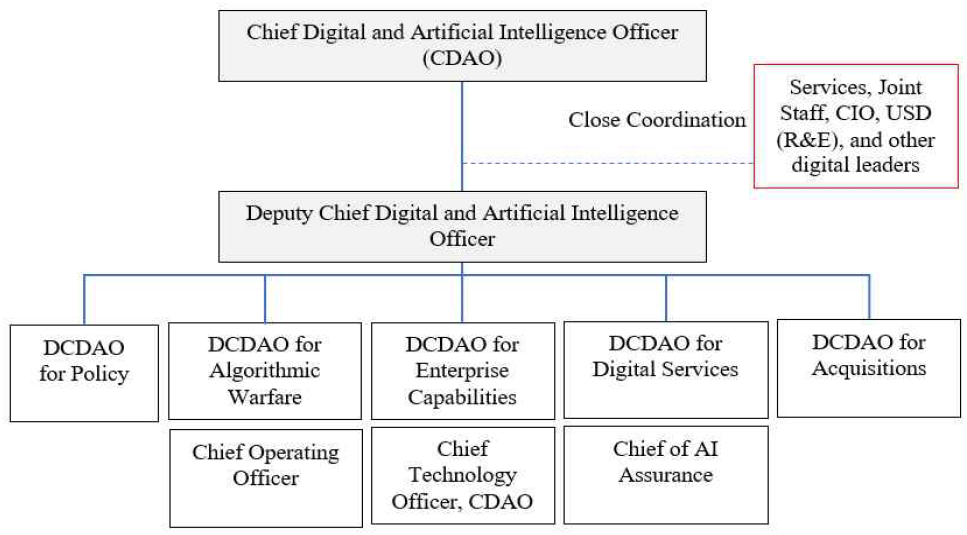
CJADC2는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지휘통제 체계로 전통적인 JADC2 체계에 ‘Combined(연합)’ 개념을 추가한 통합 작전 전략이다. 이 체계는 지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 등 모든 전장 도메인을 하나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작전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분석하고 신속·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OODA 루프(Observe–Orient–Decide–Act)의 순환 속도를 극단적으로 단축하여 전술 우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CJADC2의 기술적 기반은 무결점 보안, 데이터 중심성, 임무 파트너 환경, 상호운용성, 방위력의 5대 핵심 요소로 구성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AI 기반 데이터 통합 플랫폼, 도메인 간 작전개념 연동, 물리·비물리적 솔루션이 병행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을 주도하는 조직이 바로 CDAO(Chief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이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CDAO는 미 국방부의 디지털·AI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역할 | 기능 |
|---|---|
| 데이터 및 AI 전략 수립과 실행 | |
| AI 기반 국방 역량 확보 및 현대화 | |
| 디지털 혁신 및 기술 도입 가속화 | |
| 기술 및 정책 자문 |
첫째, 데이터 및 AI 전략 수립: 국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AI(RAI) 원칙과 윤리 기준을 제시하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전반적 표준화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AI 기반 국방역량 확보: 무인 시스템, 지휘체계, 정보 분석 등 다양한 군사 영역에 AI를 적용하고,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 및 사이버 방어 기능을 고도화한다.
셋째, 디지털 혁신 및 기술도입 가속화: 최신 민간 기술을 군에 도입하고, 민간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로의 전환을 이끈다.
넷째, 기술 및 정책 자문: 데이터 및 AI 기술과 관련된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국방부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및 각군 참모총장과 협력하여 디지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전략적으로 CJADC2는 미군 각 군이 운영 중인 주요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상위 프레임워크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공군의 ABMS(Advanced Battle Management System)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드론, 정찰기, 미사일 방어체계를 연결해 실시간 전장 분석을 지원하며, 육군의 Project Convergence는 자율성, HMC(Human-Machine Collaboration), 로봇공학 기반 기술을 실험하고 다국 간 데이터 호환성을 검증하였다. 해군의 Project Overmatch는 ‘해군 작전 아키텍처’를 통해 다양한 해상·공중·지상 무기체계를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전술 지휘 자동화를 구현한다. 나아가 CJADC2는 ‘Mosaic Warfare(모자이크전)’ 전략과도 긴밀히 연계된다. 이 개념은 소형·분산형 전력을 유연하게 조합하여 신속히 재구성함으로써, 적에게는 전술적 혼란을, 아군에게는 기민한 작전 실행력을 부여하는 전투 구조다.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이 전략에서 인간 지휘(Human Command)와 기계 통제(Machine Control)를 결합하는 체계를 개발 중이며, AI가 전술 옵션을 제시하고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AI-Human 협업 기반의 전장 기동성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LEO(Low Earth Orbit, 저궤도) 위성통신은 군사 위성통신 체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 국방부는 Starshield 프로그램을 통해 LEO 기반 초연결 위성망을 도입하고 있다. 이 위성들은 Starlink의 상업용 구조와 달리, 고급 암호화 기능과 정부 주도 제어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용 위성체계로서 미국 국방부가 직접 통제권을 갖는다.
기술적으로 Starshield는 기존 Ku/Ka-밴드 외에 E-band (71–76GHz, 81–86GHz) 대역을 사용하여 대용량 통신과 전자기 간섭 저항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주파 주파수는 데이터 폭이 넓고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장 통신용으로 적합하며, 지상 통제 게이트웨이와 위성 간 레이저 통신까지 포함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되었다.
운영 전략상 Starshield는 COMSATCOM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과 군이 혼용되는 미래 복합전장(Multi-domain Battlefield)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특히, LEO 기반 통신은 정지궤도 위성(Geostationary Earth Orbit, GEO) 대비 지연시간(latency)이 현격히 짧고, 재편성과 확장성이 뛰어나 전술통신, 미사일 경보, 데이터 링크 등에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한다.
예산 측면에서도 이러한 전략 변화는 명확히 드러난다. 국방부 차관실(OUSD)는 2025년 기준 LEO 기반 통신과 관련된 R&D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120% 이상 증가한 17억 3,080만 달러로 편성하였다. 특히 미사일 경보 및 추적 시스템, 위성 통제 네트워크, 협대역 위성통신 등 다수 항목에서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
Beyond 5G(B5G)는 초고속(>100Gbps), 초저지연(<1ms), 초연결(>100만 단말/㎢)을 구현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로 MUM-T 작전 및 CJADC2 체계와의 결합을 통해 실시간 전장 데이터 수집·분석·명령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를 Cyber-Physical Systems (CPS) 기반의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구조와 통합하여 UAV, UGV, 센서 등 전장 내 다중 노드(Node) 간의 지연 없는 자율형 데이터 교환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그림 2의 B5G 전략 로드맵은 이러한 기술 통합의 발전 경로를 도식화한 것으로, 지상 RAN(Radio Access Network)과 LEO 위성망을 연계하는 IB5G–NTN(Innovative B5G–Non-Terrestrial Network) 구조를 중심으로, 분산형 전장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네트워크 복원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구조는 Mosaic Warfare 전략과 연계되며, 상황 변화에 따른 자율 최적화가 가능한 통신 인프라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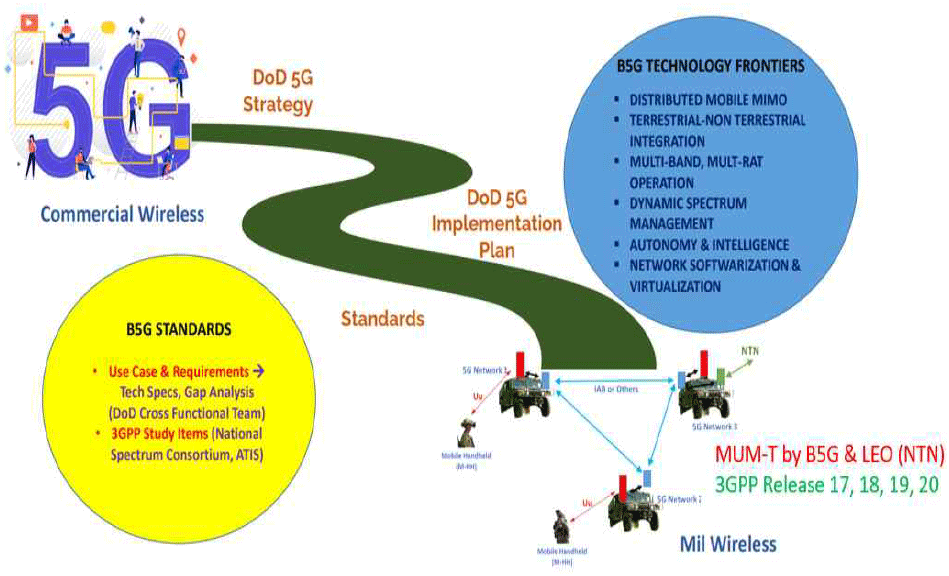
2025년 국방예산은 B5G 관련 신규 항목을 포함하여 1,240만 달러(한화 170억원)를 배정하였고, DARPA의 ‘Network-Centric Warfare Technology’에는 8억 8,650만 달러(한화 1조 2,184억원)가 편성되었다. 이는 B5G–CPS 기반 네트워크가 단순 실험 단계를 넘어, AI-MUM-T 연계 실전 배치 수준의 시스템 개발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4. RDT&E 기반 기술정책 분석
2024년 미 국방부(DoD)는 CJADC2의 실전 적용을 위한 전환을 본격화하며, 기준년도 예산안에서 개념 설계 및 시범 운용을 넘어 운영지원을 중심으로 한 예산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국방장관실(CDAO)을 중심으로 요청된 3억 7,180만 달러 규모의 체계개발 및 검증 예산은 비교년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이는 네트워크 기반 지휘통제 기능, AI 연동 상황인식 시스템, 실시간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에 사용된다.
또한 2억 2,290만 달러의 별도 신규 예산이 운영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되어 지휘관 현장 배치 장비, 통합 C2 서버, 전술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 운용 등 실제 작전 적용 기반 마련에 집중되었다. 표 2의 JADC2 R&D 세부 항목에 따르면, AI/ML 기술의 고등기술개발(Advanced Technologies)은 비교년도 대비 196% 증액, 해군의 AI/ML 운용 예산이 신설되는 등, AI 기반 지휘통제 기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OSD 전체 예산이 일견 축소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운영부문 예산으로의 재편성과 구조적 전략 전환을 의미한다.
자료: OUSD (2024)[9] 재구성
CJADC2 기술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미 국방부는 전자전(Electronic Warfare, EW) 및 사이버 보안(Security)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표 3에 따르면, 육군의 EW 시스템 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801% 증가한 3,590만 달러, 해군은 215% 증가한 1억 3,910만 달러, 공군은 131% 증가한 1,920만 달러를 각각 요청하였으며, 이는 다도메인 통신 및 전파 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적 조치로 해석된다.
자료: OUSD (2024)[9] 재구성
또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되고 있다. DISA는 국방 산업기반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DIB Cyber Security Initiative)에 1,550만 달러(94% 증가), 정보시스템 보안 프로그램에는 3,140만 달러(368% 증가)를 요청하였다. 해당 예산은 연합 작전환경에서 무결점 보안(Zero Trust) 구현과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 고도화를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CJADC2의 네트워크 중심 작전 구조에 필수적인 보안 기반 강화를 뒷받침한다.
LEO 기반 위성통신은 미국 국방부의 전장 통신망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술로, 특히 SpaceX의 Starshield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사일 경고 및 추적(Resilient Missile Warning & Tracking), 상업용 위성통신 통합(COMSATCOM Integration), 지상 통제 인프라 구축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표 4에 따르면, 우주군이 요청한 LEO 기반 미사일 경고·추적 예산은 비교년도 7억 8,630만 달러에서 기준년도 17억 3,080만 달러로 120% 증가하였고, 이는 위협 탐지, 궤적 분석, AI 기반 대응 체계 개발 및 MDA(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통합 운용을 포함한다.
자료: OUSD (2024)[9] 재구성
상업용 위성통신 통합 예산은 비교년도 1,830만 달러에서 기준년도 1억 3,440만 달러로 632%의 이례적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민간 통신 위성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보안 게이트웨이 및 암호화 인터페이스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대역 위성통신(120% 증가), 위성 통제 네트워크(157% 증가), 전략적 통신체계(ESS, 113% 증가) 등에 대한 투자도 동반 확대되었다.
육군 또한 SATCOM Ground Environment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83% 증액하여 요청하였으며, 이는 지상국 자동화, 데이터 동기화, 트래픽 제어 기능을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LEO 및 우주통신 분야에 대한 기준년도 총예산은 38억 610만 달러로 비교년도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 국방부의 우주전장 주도권 확보 및 통합 네트워크 전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업용 위성통신 통합(COMSATCOM Integration) 항목도 주목할 만하다. 비교년도 1,830만 달러였던 해당 예산은 기준년도 1억 3,440만 달러로 632%라는 이례적인 상승 폭을 기록하였다. 이는 민간 통신 위성과의 상호운용 체계, 보안 게이트웨이, 통신 암호화 인터페이스 구축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AI 및 MUM-T 기술은 미 국방부의 전장 혁신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기준년도 예산안은 이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확대 투자를 반영하고 있다. 육군은 AI/ML 기술에 대해 기초연구 1,030만 달러(29% 증가), 응용연구 2,030만 달러(31% 증가), 고등기술개발 1,820만 달러(196% 증가)를 각각 편성하였고, 해군은 UUV(무인잠수정) 운용을 위한 AI 기술에 2,850만 달러의 신규 예산을 배정하였다. 특히 MQ-4C UAV의 MUM-T 연동 고도화에는 4억 4,400만 달러(196% 증가)가 투입 계획이다.
표 5에 따르면, UAV(무인항공기) 분야에서는 소형 무인기(S-UAV) 관련 예산이 31% 및 502%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대드론 체계(C-UAV) 개발 및 시연 항목에서는 416%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또한 Unmanned Aircraft System Universal Products는 134% 증가, Counter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Advanced Development는 64%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Satellite Control Network는 157% 증액되며 위성 통제 역량과 연계된 전술 운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UAV 전체 예산은 비교년도 대비 118% 증가한 4억 980만 달러로 집계된다.
자료: OUSD (2024)[9] 재구성
무인 지상전투차량 체계(Remote Controlled Vehicle, RCV) 분야에서는 전투차량 개선 프로그램이 46% 증가(2억 7,290만 달러), Ground Robotics는 13% 증가한 2,83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전체 RCV 예산은 45% 증가한 6억 80만 달러로 편성되었다. 반면 일부 항목(TUGV, MGV)은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DARPA는 2025년 CJADC2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Network-Centric Warfare Technology(8억 8,650만 달러, 34% 증가), C3S(15% 증가), ICT(9% 증가) 등 총 16억 1,920만 달러 이상을 편성하여 Mosaic Warfare 및 분산형 AI 지휘체계의 기술 선도를 지속하고 있다. MQ-1, RQ-11, MQ-8 등 UAV 성능개량 및 드론·안티드론 통합체계에도 약 8억 달러가 배정되며, MUM-T 관련 전장 적용 기술이 개념검증 단계를 넘어 실전배치 수준의 통합 운용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5. 우리의 시사점
AI 기반 MUM-T의 전략적 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MUM-T 개념을 국방기획 체계의 최상위 구조에 반영해야 한다. 작전계획 및 전력소요 체계에 MUM-T 관련 전력군 편성을 제도화하고, 지휘통제체계는 CJADC2 개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운용 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한국형 전구작전 모델 내에서 이를 연동할 수 있는 교범 및 훈련체계의 구축이 선결 과제로 인식된다.
국내도 LEO 위성통신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독자적 군 위성 확보 및 상업용 위성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기술·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14] 특히 우주전장화를 고려한 ‘지상-공중-우주’ 연계형 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상용위성 이용 기준, 군사보안 프록시 설정, 클라우드 기반 위성 게이트웨이 연동 등의 세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동맹국의 LEO 통신망에 대한 정보 접근권 및 연합훈련 기반도 동시에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AI와 B5G 통신 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Cyber-Physical Systems(CPS) 기반의 실증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15] 이를 위해 엣지 컴퓨팅, 분산 클라우드, 자율 네트워크 복원 기술이 결합된 AI-전술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 전장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범부대 기반의 실전 테스트베드 운용이 요구된다.
그림 3의 K-CJADC2 플랫폼은 이러한 구조적 통합의 모델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UAV·UGV·센서 등 다양한 무인체계가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수집·분석·전송하는 분산형 네트워크 운용 개념을 표현한다. 본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엣지 기반 인프라를 통해 MUM-T 운용과 실시간 지휘통제(C2)의 연계, AI 기반 예측 분석, 전술적 의사결정 자동화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차세대 K형 CJADC2(K-CJADC2) 지휘통제 체계의 핵심 구현 구조로 제시된다.
미국의 RDT&E(R&D, Test and Evaluation) 예산 구조와 같이, 국내 역시 MUM-T 및 지능형 통신기술군을 전담할 수 있도록 기능별·임무별 세분화된 예산 코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응용연구–시험평가–시범운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투자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주기 관리체계 수립으로 확장될 수 있다.
표 6에 따르면, 국방 ICT 분야는 양자과학, 5G/6G 이동통신 등 기회영역, 신뢰기반 AI, 자율화, 네트워크 중심 C3, 우주기술(LEO), 첨단 SW 등 유효영역, 사이버·전자전 대응을 위한 통합 센싱 등 특화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는 국내 국방 R&D 투자 방향이 단일 기술군 중심에서 벗어나, 임무 중심 복합기술군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기반의 전략기술 펀드 조성이 필수적이며, 민군 공동 R&D, 기술이전 촉진, 제도적 투자 유인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CJADC2 기반 전장 통합체계는 다국간 공동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단일국가 중심의 전략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및 NATO 주요 회원국들과의 연합운영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 전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통합, 정책·운용 표준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에 MUM-T 운용 시나리오를 내재화하고, 연합 지휘통제 시뮬레이션 기반 실험환경을 확대함으로써 CJADC2 실전 적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표 7은 주요 회원국과의 연합 작전 운용을 위한 기술·전술 통합 구조를 다차원적으로 제시한다. LEO, 드론, UAV 등으로 구성된 정찰·관측 기반에서 시작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반 의사결정을 거쳐 행동단으로 연결되는 JADC2 OODA 루프 구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LEO–B5G–양자통신 기반의 멀티도메인 통신 인프라, 전자전 대응 주파수 전략, 유무인 전력의 1:1, 1:N, N:N 연동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16] 또한, NATO STANAG 기반의 통신 및 데이터링크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다국적 상호운용성 확보 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연합작전 대응능력 강화에 필수적 기반이 된다.
6. 결 론
본 논문은 CJADC2,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MUM-T), LEO 위성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 국방기술 전략과 RDT&E 예산 흐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차세대 국방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미 국방부는 다영역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목표로 전략 기술군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예산 구조와 지휘통제체계 전반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요 기술군에 대한 국방예산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기술 분야가 작전 개념 및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가의 나열이 아닌, 전략 기술이 정책적 구조 속에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한국형 지휘통제체계(K-CJADC2) 수립을 위해 실증 가능한 B5G–AI 기반 전술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핵심요소는 엣지컴퓨팅과 자율 복원형 통신 구조이다. 둘째, 전략기술군을 기회·유효·특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능 중심의 예산 코드 신설과 전략기술 펀드 조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군 공동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고 국방 R&D의 전략적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다국 간 연합작전 체계 정립을 위한 연합훈련 시나리오, 통신 프로토콜의 상호 연동성 확보, 지휘결정 알고리즘의 표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AI–MUM-T–CJADC2–LEO 기술의 통합은 미래 지휘통제체계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기술적 실증은 국방혁신의 지속성과 전략적 자립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구조와 정책 프레임 내에서의 기술 연계성을 심화 분석하고, MUM-T 기술이 실제 무기체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증하는 사례 중심의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